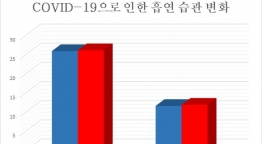"환자분, 얼마나 아프세요? 아픈 정도를 1~10까지 숫자로 표현해보세요."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 받게 되는 질문이지만, 난감하다는 환자가 많다. 본인의 통증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환자 본인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만성통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캐나다 웨스턴대 연구팀이 통증 민감도를 측정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최근 미국의학협회 신경학 저널에 발표했다. 두 가지의 뇌파를 측정해 분석하면 개인이 얼마나 통증에 민감한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관적 경험이었던 통증을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구팀은 뇌파의 일종인 PAF(감각운동 피크 주파수)와 CME(피질운동 흥분성)를 측정했다. PAF는 운동과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나오는 뇌파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많이 나온다. CME는 뇌의 운동피질에서 나오는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말한다. CME가 높을수록 뇌의 신호가 근육에 빨리 전달된다.
연구팀은 피실험자 150명을 모집해 신경성장인자를 턱 근육에 주입했다. 신경성장인자를 맞은 피실험자들은 4주간 만성통증을 겪게 된다. 4주 후 피실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그룹과 덜 느끼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두 그룹의 PAF와 CME를 각각 측정한 결과,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PAF와 CME가 모두 낮았다. 흥분 상태에서 신경 신호가 느리게 전달될수록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이다. 두 신호는 각각 뇌전도(EEG)와 경두개 자기자극(TMS)를 이용해 측정했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 신호를 조합해 통증 민감도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해냈다. 앞으로는 환자의 통증 민감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자 맞춤형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통증 민감도를 고려해 수술 계획과 통증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특성에 맞게 진통제 투여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면 만성통증 환자와 급성통증 환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통증 유형을 구분하려면 의사가 환자를 상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뇌파 측정으로 통증의 정도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